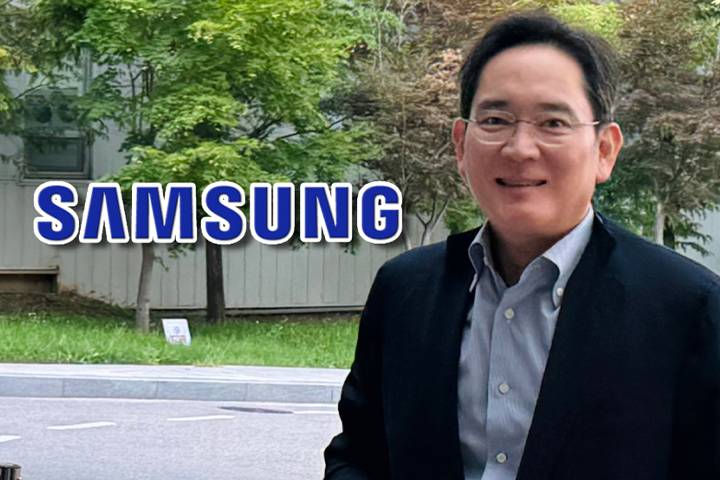자살 막으려면 ‘이것’부터…우울증 아닌 ‘충동성’과 ‘술’이 진짜 원인이었다
2025-11-24 17:29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이전에 우울증을 진단받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자살 예방의 초점을 단순히 개인의 우울감 해소에만 맞춰서는 안 되며,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 유타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자살 사망자 2769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자살=우울증’이라는 공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번 연구는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이전에 우울증을 진단받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자살 예방의 초점을 단순히 개인의 우울감 해소에만 맞춰서는 안 되며,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국 유타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자살 사망자 2769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자살=우울증’이라는 공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번 연구는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중 생전에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51.7%(143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8.3%는 과거 자살과 관련된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진단 여부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체 대상자 중 우울증 진단을 받은 비율은 41.7%에 그쳤다. 특히, 자살 시도 등 사전 징후가 있었던 집단에서는 3분의 2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아무런 징후가 없었던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5명 중 1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비극을 맞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연구팀은 두 집단의 유전적 소인을 분석하며 더 깊은 원인을 파고들었다. 그 결과, 사전 징후 없이 자살한 집단은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질환 관련 유전적 위험도가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 유전인자가 있었으니, 바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알코올 중독 관련 인자였다. 놀라운 점은 이 두 가지 유전적 소인이 사전 징후가 있었던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결국 두 집단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공통점은 우울증이나 특정 정신질환이 아니라, 충동성을 조절하는 능력의 문제와 음주 관련 유전적 특성이었던 셈이다.
이번 연구는 우리 사회의 자살 예방 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다. 연구를 이끈 힐러리 쿤 교수는 "사람들의 우울감을 줄이는 데만 집중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평소 우울감을 느끼지 않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충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신질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충동성 조절 훈련, 음주 문화 개선,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이나 과도한 직업적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